그림에서 보면 송과체는 시상끈에 연결되어 있다.
시상(視床)에서 “시”자가 볼 시 자다.
송과체(松果體)란 솔방울 모양이란 뜻이다.
송과체는 눈과 눈 사이에 있는 인당에서 머릿속으로 직선을 긋고 두 귀 사이를 직선으로 그어서 두 직선이 만나는 곳에 있다.
“할머니! 무엇이 우릴 밤에 잠들게 해요?”
“머리 가운데 있는 송과체지.”
“송과체요?”
“솔방울 모양이라고 송과체, 송과샘, 솔방울샘이라고 해.”
“어떻게 잠들게 해요?”
“이곳에서는 빛을 볼 수 있어.”
“머릿속에서 어떻게 빛을 봐요?”
“머리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본다는 이야기도 있고.”
“다른 곳에서도 빛을 받나요?”
“간뇌의 시신경 교차핵에서 빛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망막에서 빛을 받는 다는 이야기도 있어.”
“어떤 경로로든 빛을 받는군요.”
“광(光) 수용체, 즉 빛 수용체로 생체리듬을 조절해.”
“생체리듬을 어떻게 조절해요?”
"생체리듬이요?"
"밤에는 자고 낮에는 활동하도록 하니 생체리듬을 조절한다고 해."
"밤에 어떻게 잠들게 해요?"
“이곳에서는 잠들게 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
“잠자는 호르몬이요?”
“멜라토닌 호르몬이 우릴 잠들게 해.”
“멜라토닌이 어떻게 우릴 잠들게 해요?”
“어두워서 빛이 송과체로 들어오지 않으면 멜라토닌을 생산해.”
“깜깜해지면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우리가 잠드는군요.”
“멜라토닌은 우릴 잠들게 하고 잘 때 체온을 낮게 해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요?”
“빛이 송과체로 들어가면 멜라토닌이 만들어지지 않아.”
“멜라토닌 양이 작아지면 잠에서 깨는군요.”
“잠에서 깨서 활동하게 하는 호르몬은 세로토닌이야.”
“세로토닌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빛을 받고 뇌에서 만들어.”
"밤에 제대로 잘려면 어두워야 하겠네요?"
"그래서 안대를 하지."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 많아져 잠들고 아침이 되면 멜라토닌이 적어지고 세로토닌이 많아져 잠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하는군요.”
송과체에서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트립토판으로 세로토닌을 거쳐 멜라토닌 호르몬을 생산한다.
멜라토닌은 머릿속에서 만드는 수면제다.
송과체는 예지능력을 가져 제3의 눈이라고도 한다.
송과체는 7살 정도까지는 발달해 있고 조숙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
7살이 넘으면 퇴화한다고 한다.
송과체에서 수면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생산한다고 한다. 송과체는 눈의 망막에 있는 신경과 연결되어서 밝고 어두움을 감지한다.
밤이 되어 어두워지면 멜라토닌을 생산해서 우리를 잠들게 하고 아침이 되어 밝아지면 멜라토닌 생산 양이 감소하여 잠에서 깨게 된다.
그래서 송과체를 생체시계라고 한다.
뇌는 낮 동안에 외부 환경 변화를 감각기에서 감지하고 감각신경(지각신경)을 통해 정보를 전달받아서 저장하고 추리하고 사고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 등을 해서 운동신경으로 명령을 내려 반응기인 근육과 샘으로 반응을 하고 활동을 하느라 노폐물이 쌓인다.
그 노폐물은 우리가 잠잘 때 치운다.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잘 자고 나면 그 다음날 머릿속이 상쾌하고 제대로 못 자고 일어나면 머릿속이 뒤숭숭하고 어리바리하다.
따라서 우리를 잠들게 하는 멜라토닌이 충분하게 잘 생산되게 하려면 자는 곳을 어둡게 하여야 한다.
환한 데서는 잘 때 검정 안대를 해서 망막으로 빛이 들어가는 것을 차단한다.
잠을 잘 자면 피부도 예뻐진다.
그러기에 미녀는 잠꾸러기라는 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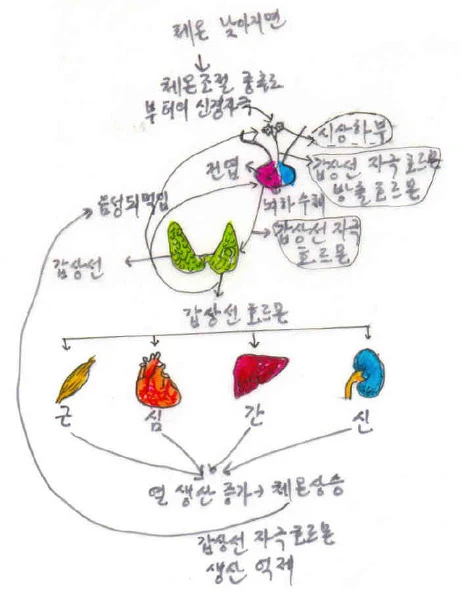





.png)
